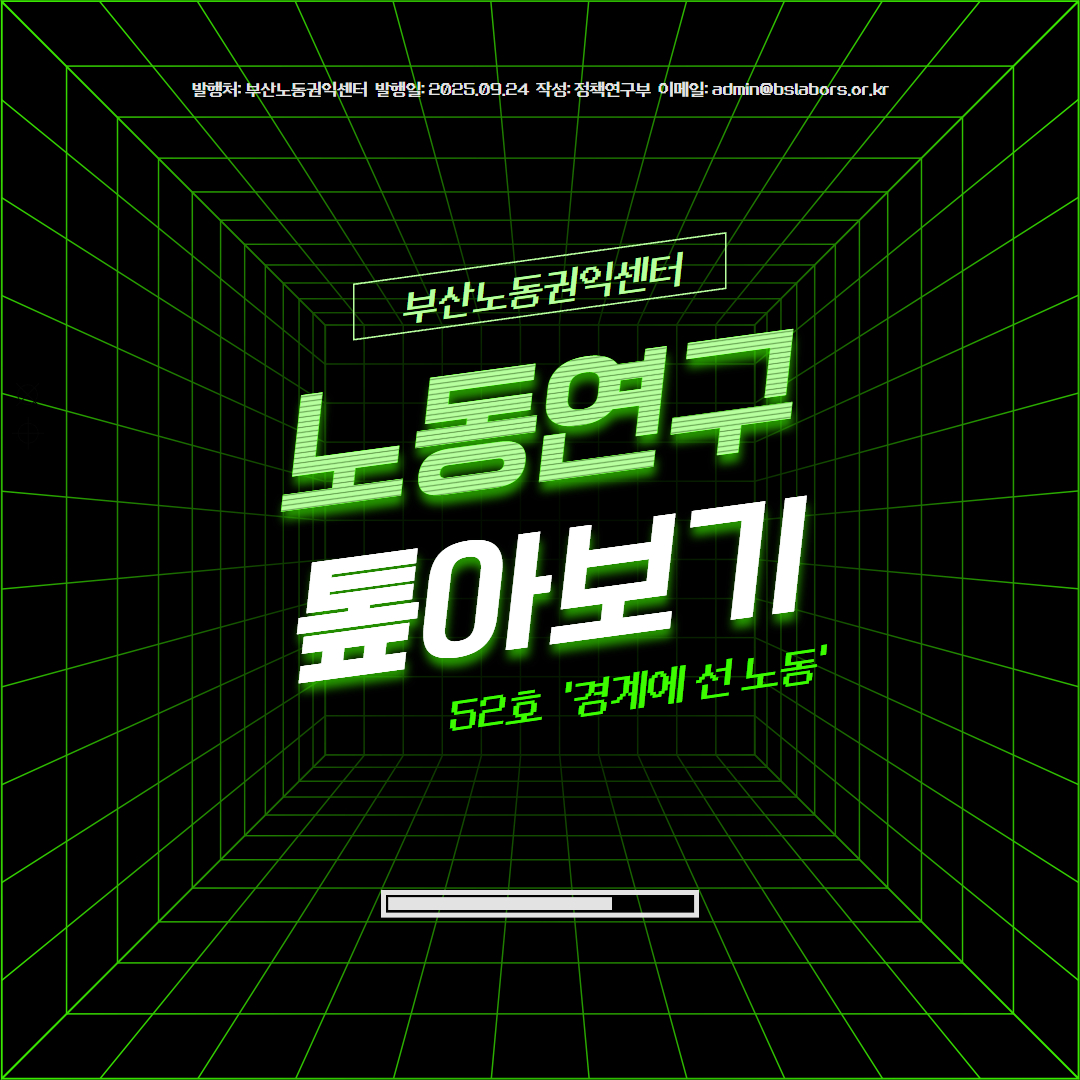‘임금중심사회’의 형성과 위기
이러저러한 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이 확산되고, 청년들이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그 가운데 사랑과 결혼, 출산까지도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을 보면서, 뭔가 사람들의 삶을 유지해주던 틀, 사회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던 기존의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적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렇다면 현재 흔들리고 있는 틀, 즉 기존에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작동을 가능하도록 해준 제도적 틀이 무엇인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을 앙드레 고르가 제기하는 ‘임금중심사회’(wage-based society) 개념을 가져와 설명하려 했다. 앙드레 고르는 임금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노동양식이 된 현대사회를 임금중심사회로 지칭했다. 임금중심사회에서는 임금노동으로 대표되는 돈을 벌기 위한 노동만이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는다. 고용, 임금노동과 결합되어 노동권 및 사회적 권리가 부여된다.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개별적 노사관계의 법적 보호가 제공되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집합적으로 사용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노동3권 보장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제도가 발전하며,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 고용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적용된다. 나아가 임금노동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 된다. 개인이 어떤 임금노동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가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타인이 자신을 판단하는 주요 잣대가 되는 것이다. 임금중심사회는 이처럼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노동의 제반 권리와 제도가 확립되고 사회적 정체성이 구성되는 사회를 지칭한다. <경계에 선 노동>에서는 20세기 형성된 임금중심사회의 틀이 디지털시대 들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위기 진단은 앙드레 고르가 진단하는 임금중심사회의 ‘소멸’ 혹은 ‘죽음’과는 구분된다. 고르는 20세기 말 고용불안정과 임금노동에 기반한 정체성 상실 등이 발생하면서 20세기에 형성된 임금중심사회가 소멸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그는 이제 노동 중심성을 버리고 탈노동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다양한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회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orz, 1997). 그런데 고르가 주장하듯 사회적 생산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노동하지 않아서, 자본의 잉여가치를 낳는 노동을 갈수록 적게 해서, 고용이 불안해지고 노동에 근거한 사회적 정체성이 희박해지며 임금중심사회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임금중심사회의 위기는 임금노동으로 대표되는 자본에 종속된 노동이 줄었다기보다는, 그러한 노동이 취해온 임금노동, 고용이라는 제도적 형식이 모호화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으로써 고용에 근거해 부여되던 사회적 권리인 노동권이 해체되거나 그로부터 배제되는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한편에서는 자영업자가 기존의 임금노동자와 유사해지는 등 자본의 지배 영역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즉, 자본에 종속된, 잉여가치를 낳는 노동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동에 근거해 부여받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도화된, 노동권으로부터 배제, 노동권의 약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임금중심사회의 위기는 고르가 주장하듯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탈노동사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의 불안정성을 심화하고 있다고 <경계화된 노동>은 주장한다. |